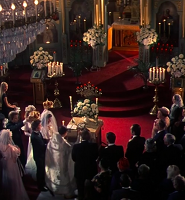|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5 | 6 | |
| 7 | 8 | 9 | 10 | 11 | 12 | 13 |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 28 | 29 | 30 |
- 프랑수아 트뤼포
- 최선의 악인들
- 오승욱
- 존 포드
- 시네마테크
- 존 카사베츠
- 웹데일리
- 영진위
- 배창호 영화감독
- 배창호
- 이두용
- 오즈 야스지로
- 버스터 키튼
- 시네마테크의 친구들 영화제
- 오승욱 영화감독
- 시네마테크 공모
- 페데리코 펠리니
- 시네마테크 사태
- 류승완
- 서울아트시네마
- 김성욱
- 고다르
- 박찬욱
- 하워드 혹스
- 시네바캉스
- 아녜스 바르다
- 2008시네마테크의친구들영화제
- 최후의 증인
- 에릭 로메르
- 빔 벤더스
- Today
- Total
CINEMATHEQUE DE M. HULOT
저주와 축복 본문
올해의 친구들에게는 공통 주제를 제안했다. ‘저주받은 영화들’을 추천해 달라 부탁했다. 장 콕토가 제안한 이 개념은 대중들에게 제대로 보이지 않는 영화들을 겨냥한 말이다. 그렇다고 이 말뜻이 1940년대의 문맥 그대로 지금 통용된다고는 말할 수 없겠다. 시네마테크 친구들이나 관객 선택의 목록에서도 딱히 일관성이 보이지는 않는다. 어떤 영화들은 제목조차 낯설지만 다른 영화들은 잊고 있었을 뿐 알려진 작품들이다. 한 번도 상영된 적 없는 무성영화가 있는가 하면 근작들도 있다. 저열한(?) 장르영화나 B영화의 목록을 발견할 수 있지만 거대 예산의 작품들도 있다. 추천자들 각자의 취향이 고려됐을 것이다.
기획자로서 물론 기대하는 것은 각자의 취향을 넘어선 새로운 영화사의 배치이다. 가령, 저주받은 영화는 당시 웰스 작품을 옹호한 바쟁의 작가주의 역사와도 맥락을 같이 했다. 바쟁은 비평적으로는 환대받았지만 흥행에서 실패의 낙인이 찍힌 작가의 계보를 영화사의 큰 마당에 끌어들였다. 실패가 그렇다고 ‘저주’의 징표라거나 작가성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쟁의 젊은 추종자들은 반대로 축복받은 작가의 계보를 꿈꿨다. 알프레드 히치콕과 하워드 혹스. 누벨바그 비평가들은 바쟁과 달리 비평가보다는 작가가 되려 했던 이들이다. 비평적으로 무시되고 있을 뿐 흥행에서 성공한 작가의 작품들을 옹호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저주받은 영화’를 곧바로 소수의 영화라거나 실패작으로만 여기는 것은 잘못된 상상이다. 차라리 누락된 영화들이라 말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소수라기보다는 영화사를 풍부하게 이끈 영화들, 이런 영화들 없이는 익히 알려진 영화사가 불가능했을 영화들 말이다. 무엇보다 여전히 큰 스크린으로 제대로 만나보고 싶었을 영화들이다. (2018.01)
'영화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메리칸 뉴시네마의 거대한 홈 무비 - 디어헌터 (0) | 2019.08.17 |
|---|---|
| 창공은 당신의 것 - 장 그레미용 (0) | 2019.07.05 |
| 2016나의 사사로운 리스트- 초콜릿 케이크와 호류지 (0) | 2017.01.17 |
| 당나귀, 우리, 발타자르 (2) | 2016.05.15 |
| 사라짐 (0) | 2016.05.14 |